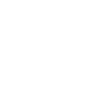new 새 여행기 작성
새 여행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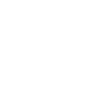
그라나다를 여행하고나서 또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하는 시점이 왔다. 어디를 가야할까 고민이 이어지는 시간. 물론, 안달루시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바르셀로나가 분명했지만 바로 가기에는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떠오른 말이 있었다.
“빠에야는 발렌시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내 사랑 빠에야. 물론, 스페인에 이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고, 스페인에 한달 반을 있으면서 츄러스 한번 안먹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빠에야야 말로 진정한 스페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빠에야의 기원이 된 지역이라고? 나는 발렌시아로 이동하기로 했다. 정말 빠에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였다.
그라나다에서는 기차를 타고 이동했고, 멀리 바르셀로나까지 가기 때문인지 어중간한 새벽에 떨어지게 되었다. 기차역 밖은 어느 도시의 새벽마냥 사람 한명 없고 도시를 밝히는 불빛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절대 나가지 않는 게 최선이다.
다행이 얼마 후 기차역 내에 있던 한 바가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이른 아침을 더불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행자지만 이른 아침 지역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날이 밝아 왔을 때 예약한 호스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또 호스텔도 문이 닫겨 있어 문제다. 결국 또 다시 호스텔 옆 바에서 다시금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른 새벽부터 기다린 끝에 들어간 호스텔. 짐을 풀고는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로 했다.
발렌시아
발렌시아 자치주의 주도이며 약 8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도시고 바르셀로나에 이은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다. 발렌시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용맹을 의미한다. 구시가지는 발렌시아 북역(기차역)에 위치하고 항구쪽으로는 예술과 과학 도시와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구시가지에는 관강객을 따라 걷다보면 유럽 특유의 대성당과 광장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사실 나로서는 빠에야 하나만을 바라보고 온 도시다보니 생각보다 큰 규모와 대리석 광장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 발렌시아가 얼마나 강성했던 지역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발렌시아 대성당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신전, 고트 시대에는 그리스도 교회, 이슬람 시대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성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성배란 흔히 최후의 만찬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기적의 산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호스텔에서 알려준 곳을 향해가던 중 꽤나 신기한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에는 대놓고 시장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사실 시장만큼 여행자에게 흥미로운 곳이 없었기에 주저 없이 찾아갔다.
건물 내부는 높은 천장과 창문 모자이크 등 뭔가 묘하게 시장스럽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는 누가 봐도 시장인 곳이었다. 관광지라고 하기엔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고, 따로 여행자를 위한 음식을 파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 곳곳에 위치한 작은 바에는 커피 혹은 간단한 술을 즐기는 현지인들로 가득했다.
중앙시장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며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더불어 역사까지 깃들어 있는 장소다. 관광지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침 시장이기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한다.
이 중앙시장에서 내가 들린 곳은 단 하나. 빠에야 가게였다. 이 가게에는 우리나라처럼 반찬 가게마냥 빠에야만을 팔고 있었는데 뭘 먹어야할지 가늠이 되질 않았다. 일단 내가 빠에야를 먹기 위해 발렌시아에 온 만큼 하나를 맛보기로 했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빠에야를 건네 받을 수 있었다.
발렌시아에서의 둘째날은 호스텔에서 추천 받은 바닷가를 향하기로 했다. 직원은 버스와 택시 등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대충 봐도 공원을 따라 걷다 바다로 간 뒤에 버스를 타고 오면 되겠다는 동선이 그려졌다.
대도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고 공원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발렌시아는 바닷가를 아에 두고 강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로로 크게 통과된 공원이 있었고 이를 따라 걷다보면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과학과 예술 도시라는 이명에 맞게 다양한 전시관 및 특이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여유를 보내듯 넓은 공원에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공원을 즐기며 넉넉히 두시간 즈음 걸었을까. 드디어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나름의 휴양지로서 넓게 펼쳐진 바다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마드리나 바르셀로나에 비해서는 유명세가 크지 않은 만큼 바다에도 현지인들 위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길게 펼쳐진 해변은 걷다가 지칠 만큼 넓었고 다시 한 번 빠에야를 먹기 위해 해변의 한 식당을 찾게 되었다.
관광지이자 해변 앞에 위치한 만큼 빠에야의 가격은 비쌌고, 맥주값도 비쌌다. 하지만 빠에야를 위해 왔기에 짧은 고민 끝에 주문하게 되었다.
빠에야
스페인의 쌀밥 요리로 볶음밥이 아닌 처음부터 밥에 재료와 육수를 넣고 끓여서 짓는 밥이다. 철판에서 만들기에 흔히들 볶음밥을 떠올리지만 엄연히 생쌀을 넣고 요리해 만들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쌀 재배가 활성화 된 발렌시아 지방에서 먹던 향토 음식이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스페인 전역으로 다양하게 발전했으며 지금은 대표적인 스페인 요리가 되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바에서도 타파스로서 제공할 만큼 인기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고기와 야채가 들어간 빠에야 발렌시아나와 해산물이 들어간 빠에야 마리스코가 대표적이며 묘하게 비슷한 비주얼이지만 이름이 다른 아로스(arroz de 재료)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먹물 빠에야의 경우 아로스 데 니그로 (arroz de negro)라 표기되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관광지의 해변에서 먹은 빠에야는 특별한 맛이 없었고, 중앙 시장에서 먹은 빠에야는 평범했다. 어찌 보면 빠에야는 비빔밥 같은 음식이 아닐까. 맛의 저점은 높지만 고점은 낮은 그러한 기본의 음식. 마치 전주 비빔밥을 먹기 위해 전주를 갔지만 기대와 달리 큰 차이가 없던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될까.
비록 빠에야 때문에 왔지만, 빠에야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은 발렌시아 여행. 이후로도 내 빠에야는 사실상 음식점보다 늘 마트나 마켓이 가장 맛있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