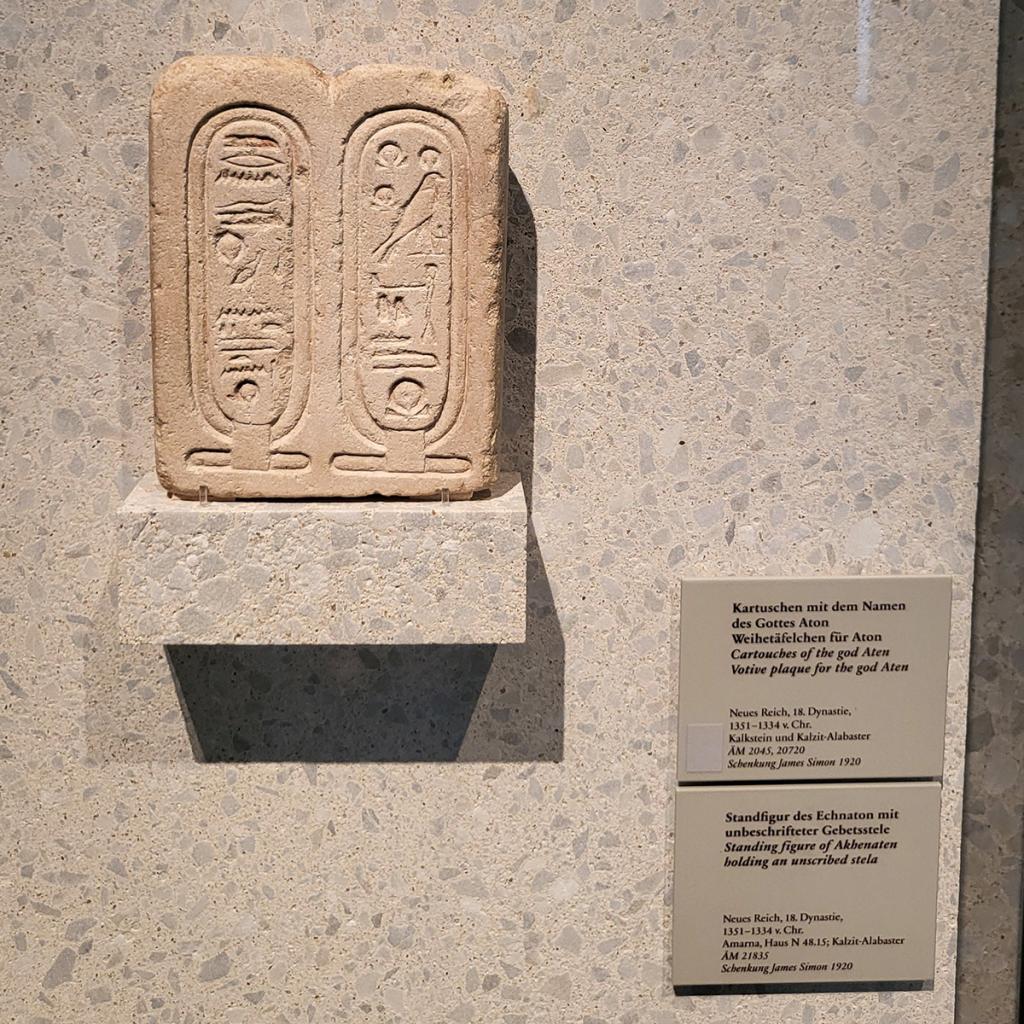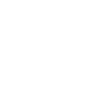관련 백과사전
ⓘ 두피디아는 수록된 정보가 상업적 목적 등 이용자가 의도한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에 포함된 의학, 법률, 세무, 금융 등 전문분야의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두피디아는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작성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을 무단 게재, 재배포 및 AI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을 무단 게재, 재배포 및 AI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